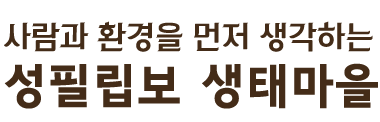수녀님 이야기

잠비아와의 인연은 1994년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잠비아의 한 주교님이 잠비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찾다 우리 수녀회의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당시 우리 수녀회가 출범한 지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편지를 받고 바로 잠비아를 찾았다.
“슬럼가는 처참했습니다. 당시 온 나라에 에이즈가 확산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구리광산이 나라의 유일한 소득이었는데 국제 구리 값이 폭락하면서 광산은 황폐해졌고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심각했어요.
빨리 와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바로 결심했죠.”
1996년 2월, 잠비아로 갔다. 한국 수녀 5명이 그와 함께했다.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익히고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렸다.
수녀들은 각각 영양사, 재봉사, 교사, 간호사 역할을 담당할 이들이었다.
무풀리라에 자리를 잡고 진료소를 열었다.
재봉·농업·요리 교실도 운영했다.
은돌라, 땀부 등 활동지역도 넓혔다.
병원을 짓고 간호학교, 수녀원을 만들어 간호사, 수녀들을 키우고 있다.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시설, 농업훈련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후원금 마련하느라 발이 닳았다.
“잠비아의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구리광산과 외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국제 구리 가격에 온 나라가 휘둘리고 그나마 광산도 외국인들이 소유해 잠비아에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희망을 ‘카사리아 에코시티’에 걸고 있다.
잠비아 정부로부터 3000ha의 땅을 받기까지 중간 역할을 했다.
“잠비아의 미래는 농업과 자급자족에 달려 있습니다. 카사리아를 시작으로 잠비아 전역에 생태도시가 이어지길 바랍니다.”